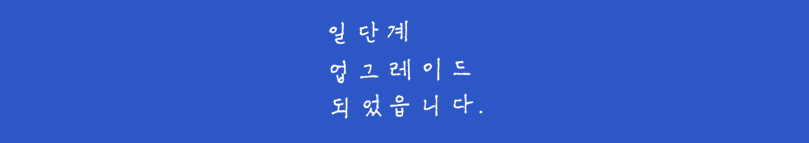
지난학기 우리 creative writing 선생님이었던 Mark는 내게 완전히 새로운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았다. 반은 한국계 반은 히스패닉 계의 근육질 소설가인데 스스로의 에너지로 불타 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. 첫 원고를 완성한 지 칠팔 년이 넘었고 두세 번이나 출판사가 바뀌면서도 아직 성에 차지 않아 깎고 다듬고 있는 그의 첫 소설 제목은 The Striphouse of God (신의 스트립클럽)이다. 실제로 한국인 이민자인 그의 어머니는 스트립클럽 주인이라고 했다. 이야기꾼이 되라는 계시나 다름없는 출생이다. 어쨌든 학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 어제 그가 메일을 보내서, 내게 전에 보내 주었던 10장짜리 발췌본은 별로라면서 도입부터 100쪽 분량을 선사했으니 바삐 읽어야겠다. 학기마다 좋은 선생님이 남으니 8% 오른 학비가 거의 안 아까울 정도다.
맨해튼 전역에 유행임이 틀림없지만, 소호를 지나가는 브로드웨이에는 특히 극심한 수법이 있다. 부딛혀 안경을 떨어뜨리고 쫓아와 물어내라는 수법인데, 오늘도 역시나 한 놈이 건널목에서 얼쩡거리더니 툭 뭔가 떨어뜨린다. 지난번에도 CB2 앞에서 그러는 놈이 있길래 「그 수법 아니까 딴 데 가서 해라」고 쏘아붙였더니 손발이 오그라들게 민망한 표정으로 뒤돌아 가던데, 오늘은 말할 기회를 찾으려는지 두세 미터 뒤에서 끈질기게 쫓아온다. 짜증이 나서 앞서 걷다가 확 뒤돌아 눈을 빤히 쳐다보고 우뚝 섰더니, 잠깐 기가 죽는 듯 하다가 이내 안경 떨어트렸으니 어떡할 거냐고 물어온다. 이런, 「돈 달라고?」그렇단다. 「얼마?」오륙십 불을 부른다. 「싫어」내 안경 어떡하냔다. 「알 게 뭐야,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달라 그래」
발걸음을 재촉해 무인양품에 들어가 가지런히 놓인 찻잔들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.
하지만 사실 북적이는 곳에서 매번 이러니 별 걱정없이 싸가지없게 꺼지라고 할 수 있지, 한적한 곳에서 이처럼 흑인이 시비를 붙여 오면 덜컥 겁부터 들 게 뻔하다. 난 중학교때부터 내가 삥 뜯어내기 적절하게 생긴 얼굴이라는 걸 알아차렸다. 방금 참아가며 본 <디-워>의 Sarah처럼 타고난 슬픈 운명인걸. 순발력과 대담성을 더 기르는 수밖에 없다. 점점 곤궁에서 빠져나오는 스릴에 재미가 붙고 있다. 그래도 불 꺼진 놀리따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. 전단지와 콘돔 하나 주려고 사거리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악 소리를 지른 것도 아까 그 흑인 때문이었어.

괜저님 꾸준한 업데로 인해 메세지 뜨기 전까지는 좀 최신형인듯 ㅋㅋ
자동 업그레이드 이에요.
가끔 들려 둘러어 에둘러 가는 나는 지나가는 사람임
이렇게 말하기 이러뭣하지만 당신은 정말 멋지오
쑥스러워요
아니 저 수법 10년째 써먹는군욤
당하는 사람이 민망하던데…
그지 고속도로같은 데였는데..
성가신사람 대처법을 배운 1인
축하..
비공개 댓글입니다.